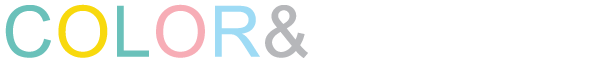[사진: 영국 말벌 Vespula vulgaris이 회향꽃 위에 앉아 있는 근접 촬영 사진. © Jackie Bale / Getty Images]
자연 속 생존 전략은 대체로 두 갈래로 나뉜다. 누군가는 잎과 흙에 섞여 눈에 띄지 않게 숨어 살아가고, 또 다른 이들은 정반대로 스스로를 드러낸다.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그리고 그와 대조되는 검정의 패턴. 파리 자연사박물관의 연구자 로망 나티에(Romain Nattier)는 이것이야말로 포식자의 눈에 가장 잘 들어오는 색이며, 초록과 갈색이 지배적인 환경에서 이처럼 튀는 색은 “나는 여기 있다. 하지만 독성이 있으니 건드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한다고 설명한다.
모나크 나비의 화려한 날개는 독성을 경고하고, 말벌의 노란-검은 띠는 강력한 독침을 알린다. 그러나 이런 신호는 본능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 인지된다. 포식자가 잘못 삼킨 후 곧 토해내면서,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특정 색과 연관 짓는 것이다. 이는 인간 역시 마찬가지다. 아이가 벌을 잡았다가 쏘이고 나면, 그 이후로는 노란-검은 줄무늬와 ‘윙’ 하는 소리에 본능적으로 거리를 둔다.
아포세마티즘(aposématisme)은 이렇게 색이나 냄새 같은 신호를 통해 공격을 예방하는 전략이다. 양서류(개구리, 도롱뇽)와 곤충(말벌, 무당벌레) 같은 집단에서 특히 흔하다. 이 방식은 일종의 윈-윈 관계를 형성한다. 먹히지 않는 쪽은 생존을 확보하고, 포식자 역시 불필요한 독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나크 나비, 말벌, 작은 독화살 개구리, 무당벌레
흥미로운 점은 자연의 교묘한 “사기극”이다. 실제 독성이 전혀 없는 종들이 이 경고색을 흉내 내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꽃등에(syrphe)다. 노란-검은 줄무늬를 지녀 말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해한 파리류다. 뱀의 세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독 없는 가짜 산호뱀은 진짜 산호뱀의 강렬한 주황-검정 띠를 모방한다. 이는 우연히 유사한 무늬를 가진 개체가 살아남고 번식하면서, 결국 종 전체에 고정되는 자연선택의 산물이다.

faux corail, belted hoverfly, Agalychnis callidryas
결국,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한 길은 단 하나다. 보이지 않게 숨든, 아니면 오히려 강렬하게 자신을 드러내든. 아포세마티즘은 두 번째 길을 선택한 종들의 생존 언어이며, 색채는 그들의 가장 직접적인 “경고 신호”다.
출처 : www.rfi.f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