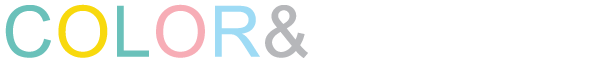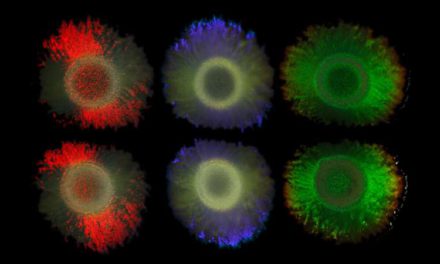도시에서 색은 늘 신호였다. 건축 외벽의 색채가 도시의 정체성을 말해주듯, 교통수단의 색 역시 시민의 일상에 질서를 부여한다. 빨강은 급행, 노랑은 간선, 초록은 지선을 뜻한다. 이 단순한 체계는 본래 효율을 위한 장치였다. 그러나 광주의 시내버스에서는 색이 안내를 넘어 신분을 구분하는 은유가 되고 있다.
정규직 운전원은 빨강과 노랑을 달린다. 반면 초록은 비정규직의 전유물이다. 겉으로는 같은 ‘버스 기사’이지만, 시민이 보는 순간 이미 그들의 노동 조건과 사회적 위치는 색으로 드러난다. 초록은 더 이상 ‘지역 연결’을 상징하는 색이 아니라, ‘낮은 처우’의 기호로 읽히는 것이다.
색채 정책의 역설
색채는 원래 공공성을 위한 도구다. 파리, 런던, 도쿄 같은 도시들은 지하철 노선의 색을 통해 이동의 편의를 높이고, 시각적 정체성을 확립한다. 그러나 광주 사례는 역설적이다. 색채 디자인이 시민 편의를 위한 언어로 기능하는 동시에, 노동자 간의 불평등을 가시화하는 장치가 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 문제를 넘어 도시 색채 정책의 한계를 드러낸다. 색이 ‘정보 전달’의 도구로 쓰이지 않고, ‘사회적 위계’를 은연중에 강화할 때, 색채는 차별의 상징으로 변한다. 이는 환경 색채 정책이 지향해야 할 “공공성”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타도시의 사례와 시사점
주요 도시에서는 노선 색이 단지 이동의 언어일 뿐, 고용 형태와 연결되지 않는다. 예컨대 지하철의 파랑, 초록, 빨강은 단지 길 찾기의 도구다. 운행 주체가 누구인지, 근무 조건이 어떤지는 시민에게 드러나지 않는다. 북유럽 도시들의 교통정책은 더욱 철저하다.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 원칙을 지키며, 색채는 오로지 ‘공공의 길잡이’로만 사용된다.
이와 달리 광주의 사례는 색이 불평등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역설을 드러낸다. 도시의 색채 체계가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제도의 불균형을 드러내는 증거물이 되는 셈이다.
색의 정의를 되찾기 위해
도시에서 색은 가장 민주적인 언어여야 한다. 누구나 알아볼 수 있고, 누구에게도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 버스의 색은 노선을 알려주는 친절한 신호여야지, 노동자의 신분을 드러내는 낙인이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제는 색을 본래의 언어로 되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특정 노선에 고착되지 않도록 제도를 재구성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그래야 초록은 다시 ‘주변부와 중심을 잇는 연결의 색’으로, 빨강과 노랑은 ‘효율과 흐름의 색’으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도시는 색으로 말한다. 그러나 그 색이 불평등을 드러내는 순간, 도시는 침묵보다 더 잔혹한 언어를 시민에게 전한다. 이제 우리는 색이 안내의 언어이자 존엄의 언어가 되도록 다시 묻고, 다시 설계해야 할 때다.
출처 : www.nocutnews.co.kr
출처 : www.nocu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