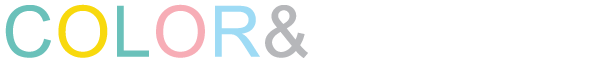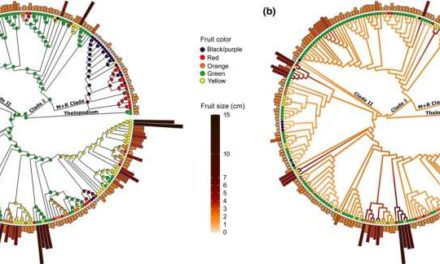프리즈 서울 2025에서의 전시는 박서보의 ‘색채 묘법’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 재현한 사례로, 전통적 매체와 첨단 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을 보여준다. 이 전시는 단순한 복제나 모사라기보다는, 색채 경험을 다른 매체적 조건 속에서 변환하는 실험적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단색화와 수행적 반복
1970년대 한국 단색화는 서구 미니멀리즘·개념미술과 동시대적 맥락에서 논의되지만, 그 방법론과 지향은 차이를 보인다. 서구가 구조와 개념을 강조했다면, 단색화는 반복 행위를 통해 시간성과 신체성을 화면 위에 기록하였다. 박서보의 ‘묘법’은 이러한 단색화의 수행성을 대표하며, 연필로 긋기·빗살 긋기 등 반복적 행위를 통해 결과물보다는 과정에 의미를 두었다.
색채 묘법의 전개
생애 후반 박서보는 ‘색채 묘법’을 통해 자연에서 유래한 색을 화면에 적용하였다. 이 색채는 기호적 장식이 아니라 경험과 기억을 담은 매개로 작동하였다. 예를 들어, 아궁이의 검정은 생활 세계의 흔적, 단풍의 붉음은 자연의 무상성, 유채꽃의 노랑은 생명력의 환기를 상징한다. 색은 반복적 수행 속에서 내적 경험과 외부 자연이 결합되는 지점으로 기능하였다.
디지털 재현의 방법
이번 전시는 O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색채 묘법을 재구성하였다. OLED의 자발광 특성은 색을 물질적 안료가 아닌 빛의 파장으로 제시하며, 관객에게 비물질적 색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화면 속 색은 정지된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시간성을 갖는 이미지로 구현된다. 이는 원작의 물질성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색채를 수행적·리드믹한 경험으로 전달하는 또 다른 방식이다.
예술사적 맥락
이러한 시도는 전통 매체와 기술적 매체가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색채 경험의 전환’을 보여준다. 모네가 빛의 변화 속에서 색을 탐구했고, 로스코가 색면을 통해 몰입적 경험을 추구했듯이, 박서보는 반복을 통해 색을 시간화하였다. 디지털 재현은 이 맥락을 확장하여, 색채를 물질적·비물질적 층위 모두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
프리즈 서울 2025의 박서보 전시는 색채 묘법이 기술 매체 속에서 어떻게 변형·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색은 안료라는 물질적 제약을 벗어나 빛과 데이터의 형태로 구현되며, 이를 통해 동시대적 감각 속에서 다시 경험된다. 이는 색채를 매체적·존재론적 관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