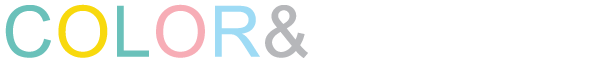[이미지: 크레타섬 크노소스의 미노아 궁전 복원은 고대 세계에서 색채가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상징적 이미지).]
사진: Johnson / CC BY-SA
우리는 오랫동안 고대를 ‘백색의 세계’로 상상해왔다. 박물관에 전시된 대리석 조각, 유적지에 남은 석조 건축은 마치 본래부터 색을 갖지 않았던 것처럼 침묵하고 있다. 이 무채의 이미지 속에서 고대는 종종 순수하고 절제된 미의 원형으로 미화된다. 그러나 색채 연구가 축적될수록 분명해지는 사실이 하나 있다. 고대는 결코 무채의 시대가 아니었다. 오히려 색은 권력과 신성, 세계관을 조직하는 핵심 언어였다.
최근 이집트 제26왕조 시기, 아프리에스 1세의 왕궁 유적에서 확인된 새로운 노란색 안료의 발견은 이러한 인식을 다시 한 번 뒤흔든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니 칼스버그 글립토테크에 소장된 장식 파편을 정밀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고대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여겨졌던 두 종류의 황색 안료가 확인되었다. 납–안티몬 산화물 황색과 주석–납 황색이다.
이 두 색은 미술사에서 오랫동안 중세 말기 혹은 르네상스 이후의 발명으로 분류되어 왔다. 주석–납 황색은 14세기 유럽 회화에서 처음 등장한 색으로, 납–안티몬 황색은 16세기 이후의 색으로 정리되어 왔다. 다시 말해, 이 노랑들은 ‘근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색’이었다. 그러나 고대 이집트 왕궁의 벽면에서 발견된 이 안료들은, 우리가 믿어왔던 색채사의 연대기를 조용히 무너뜨린다.
이 연구는 브리티시 뮤지엄, 피사 대학교, 덴마크 남부대학교가 참여한 국제 공동 연구로 진행되었다. 연구진은 안료의 화학적 조성뿐 아니라, 그것을 석재 표면에 고정하기 위해 사용된 결합제까지 분석했다. 그 결과, 고대 장인들은 아카시아 수지와 동물성 접착제를 조합하여 색을 정착시키고 있었다. 이는 색이 단순히 ‘발라진 결과’가 아니라, 재료의 성질과 환경 조건을 이해한 기술적 선택이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발견이 단지 “새로운 안료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핵심은 고대 사회가 색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통제했는가에 있다. 노랑은 언제나 특별한 색이었다. 태양, 금, 신성, 불멸, 그리고 권위를 상징하는 색. 그 노랑이 왕궁의 벽면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이 색이 일상적 장식이 아니라 권력의 시각적 언어였음을 암시한다. 색은 장식이 아니라 질서였고, 안료는 정치적 선택이었다.
우리가 오늘날 고대 유적을 ‘색을 잃은 상태’로 바라본다는 사실 또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색이 사라진 것이지, 애초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시간과 기후, 침식과 파괴 속에서 색은 탈락했지만, 그 부재가 곧 본질은 아니다. 이번 황색 안료의 발견은 고대 도시와 건축이 훨씬 더 강렬하고 다층적인 색의 세계 속에 존재했음을 상기시킨다. 고대 공간은 회색의 유적이 아니라, 색채의 교향곡이었다.
결국 이 노랑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의 질문이다. 색은 언제나 기술과 문화, 물질과 상징의 경계에서 탄생한다. 고대의 노랑이 중세와 근대를 앞질러 존재했다는 사실은, 색채의 역사가 단선적 진보가 아니라 반복과 망각, 재발견의 과정임을 보여준다. 우리는 종종 ‘언제 처음 등장했는가’를 묻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어떤 색이 기억에서 탈락했고, 왜 다시 발견되어야 했는가.
출처 : www.epochtimes.f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