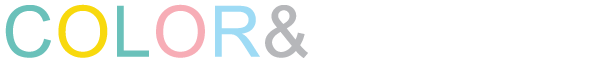1. 이탈리아 부라노 – 무지개 마을
이탈리아 베네치아 라군 북쪽에 자리한 작은 섬 부라노는, 마치 거대한 팔레트 위에 놓인 듯 다채로운 색으로 가득한 풍경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세계 곳곳에서 몰려드는 여행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는 이유는 단순히 “예쁜 집들” 때문만은 아니다. 이 마을의 색채는 역사와 실용, 그리고 공동체적 규율이 만들어낸 독특한 산물이다.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부라노의 집들이 이렇게 화려해진 것은 안개 짙은 날 귀항하는 어부들의 필요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각기 다른 색으로 집을 칠해 두면 바다에서 멀리서도 자기 집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다. 바다와 생계를 함께한 사람들의 지혜가, 세월이 흐르며 하나의 경관이 된 셈이다.
오늘날 부라노의 색은 더 이상 우연에 맡겨지지 않는다. 집을 새로 칠하고 싶다면 반드시 시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민은 정해진 팔레트 내에서만 색을 고를 수 있다. 이렇게 엄격한 규율이 오히려 마을의 정체성을 지켜내며, 무질서 속의 조화를 만들어낸다.
강렬한 빨강, 선명한 파랑, 눈부신 노랑과 초록이 물 위에 반사될 때, 부라노는 그야말로 ‘무지개 마을’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풍경을 완성한다.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부라노 공동체가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를 색으로 증명해 온 결과다. 오늘날 이 색채는 지역의 상징이자, 세계인들을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한 관광 자원이 되고 있다.

2.블루 시티, 모로코 쉐프샤우엔
모로코 북부 리프 산맥 기슭에 자리한 셰프샤우엔은, 그 이름만큼이나 푸른 빛으로 기억되는 도시다. 골목마다 이어진 건물의 벽과 계단, 문짝까지 모두 푸른색으로 칠해져 있어, 마치 하늘과 바다가 내려앉은 듯한 풍경을 이룬다. 그 유래에는 여러 설이 얽혀 있다. 유대인 공동체가 정착하면서 푸른빛을 ‘신성’의 상징으로 사용했다는 해석, 혹은 여름 더위를 식히고 모기를 쫓기 위한 실용적 이유라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이유가 무엇이든, 이곳의 푸른빛은 여행자들에게 신비로운 몰입감을 선사하며,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낸다.

3.콜롬비아 과타페 – 남미의 모자이크
안데스 산맥 동쪽 기슭, 메데인에서 차로 두 시간가량 달리면 나타나는 작은 도시 과타페는, 그 이름만으로도 색채의 향연을 예고한다. 거리를 따라 걷다 보면 건물 외벽마다 정성스럽게 채워진 소칼로(zócalo) 라 불리는 벽 장식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단순히 벽을 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집마다 모자이크처럼 입체적인 부조와 그림이 채워져 있어, 도시 전체가 살아 있는 미술관처럼 펼쳐진다.
이 색채적 전통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매개체다. 어떤 집의 벽에는 소를 몰던 시절의 장면이, 또 다른 벽에는 음악가의 악기가, 혹은 성스러운 상징이 새겨져 있다. 각각의 색과 그림은 그 집안의 역사, 직업, 신념을 담고 있어,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사회적 기록을 읽어내는 경험이 된다.
과타페의 색은 또한 현대적 재해석을 거쳐 관광 자원으로 자리 잡았다. 지역 정부와 주민들이 힘을 모아 집집마다 소칼로를 복원하고 더욱 다채롭게 가꾸면서, 오늘날 과타페는 ‘남미의 모자이크 도시’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강렬한 빨강과 노랑, 청록과 분홍이 서로 부딪히면서도 묘한 조화를 이루고, 이러한 대비는 남미 특유의 에너지와 낙관성을 상징한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점은, 이 도시가 보여주는 색채가 단순히 외관을 꾸미는 장식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곧 주민들의 정체성과 기억, 그리고 공동체가 스스로를 세계 앞에 드러내는 방식이다. 과타페의 거리를 걷는 여행자는, 하나의 집 앞에서 멈춰 서는 순간, 그 안에 살았던 세대들의 이야기를 모자이크 조각처럼 이어 맞추게 된다.

4.퀴라소(Curaçao)의 빌렘스타트
카리브해 푸른 바다 위에 자리 잡은 퀴라소의 수도 빌렘스타트는, 그 자체로 하나의 색채 이론을 증명하는 도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도시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의 건축 양식 위에 카리브 특유의 화려한 색이 덧입혀져 있다. 낮은 지붕의 집들과 바로크풍 건물들이 선명한 파스텔 톤으로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유럽의 도시가 열대의 빛을 입어 새롭게 탄생한 듯한 풍경을 이룬다.
이 다채로운 색채에는 흥미로운 유래가 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네덜란드 총독이었던 알버트 키크베르크(Albert Kikkert)가 하얀 건물의 눈부심으로 두통을 호소하면서, 주민들에게 건물을 다양한 색으로 칠하도록 명령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실용적 이유로 시작된 색채의 변주가, 시간이 흐르며 도시의 정체성이자 문화적 상징으로 굳어진 것이다.
오늘날 빌렘스타트의 건물들은 규율 속의 자유를 보여준다. 행정 당국은 건물 보존과 함께 허용된 색채 팔레트를 유지하며, 집주인들은 그 안에서 자신들의 개성과 문화적 뿌리를 드러낸다. 노랑, 민트, 핑크, 코발트 블루 같은 강렬한 색이 해변의 햇빛과 어우러질 때, 건축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시각적 축제가 된다.
이러한 풍경은 “Caribbean Color Theory”라 부를 만하다. 식민지 시대의 유럽 건축 규범, 열대의 태양과 바다라는 자연적 조건, 그리고 현지 주민들의 문화적 표현 욕구가 결합해 ‘빛의 강도에 맞서 색으로 응답하는 도시’가 만들어진 것이다. 하얀 벽에 반사된 눈부심을 피하려던 초기의 필요는 이제 ‘색을 통한 자기 정체성’이라는 문화적 선언으로 확장되었다.
빌렘스타트의 거리를 거닐다 보면, 단순히 예쁘고 화려한 색 이상의 의미가 다가온다. 그것은 카리브해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역사와 현실을 색으로 풀어내고, 식민의 기억을 문화적 자산으로 전환했는지를 보여주는 산 증거다. 건축의 색채가 곧 역사와 정체성의 언어가 되는 공간, 그것이 바로 빌렘스타트다.

참고 : www.lessentiel.l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