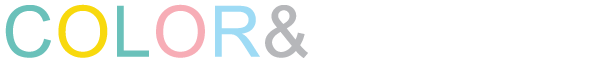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선명한 보라색 코트와 모자를 착용했다.
팬톤의 올해의 컬러가 발표된 12월 7일 영국 포츠머스에서 열린 해군 행사에 참석한 엘리자베스2세 여왕. 선명한 보라색 코트와 모자를 착용했다. [이미지출처:AFP 연합]
“어려운 컬러라면 그만큼 도전할 만하다.” 런던 디자이너 브랜드 ‘레지나 표’ 표지영 디자이너의 이야기다. 반대로 생각하면 자신의 취향, 남과의 차별화가 색 하나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트렌드분석업체 ‘트렌드랩506’ 이정민 대표 역시 “올해의 컬러는 소비자에게 ‘이런 색도 있어’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면서 “지금껏 선택 영역 밖에 있던 컬러에 눈길을 주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론과 실제가 다르듯, 보라색에 대한 패션계의 반응은 한마디로 ‘어렵다’로 모아진다. 색 하나를 두고 귀족적, 극도의 예민함, 예술적 감성, 정신적 혼돈 등 넓은 스펙트럼으로 표현되는 탓이다. 밝고 귀여운 노랑, 미래주의적 실버 라는 식으로 명쾌하게 단언하기 쉽지 않다. 김민경 한국케엠케색채연구소장은 “보라색 입은 여성을 보고 마녀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남이 나를 알아봐주기 바라는 자존감 높은 사람이 택하는 컬러”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보라색은 우리 눈에 익숙치 않다. 실제로 인테리어는 물론 화장·옷에서도 보라색은 흔히 볼 수 없는 색이다. 유럽에 비해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흰색·검정·회색 등 무채색이 압도적인 국내에선 더욱 그렇다. 여성복 브랜드 ‘쟈니헤잇재즈’의 최지형 디자이너는 “포인트 컬러라 해도 레드·블루·그린 등 기본 원색에 눈이 길들여져 있어 보라가 더욱 낯설다”고 말했다. 2017년 연두색 ‘그리너리’가 거의 주목받지 못한 이유와 비슷하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팬톤의 선택에 대해 “맥락 없는 결정”이라면서 “차라리 아이폰X의 컬러를 올해의 컬러로 하는 게 낫겠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원문보기 : 중앙일보